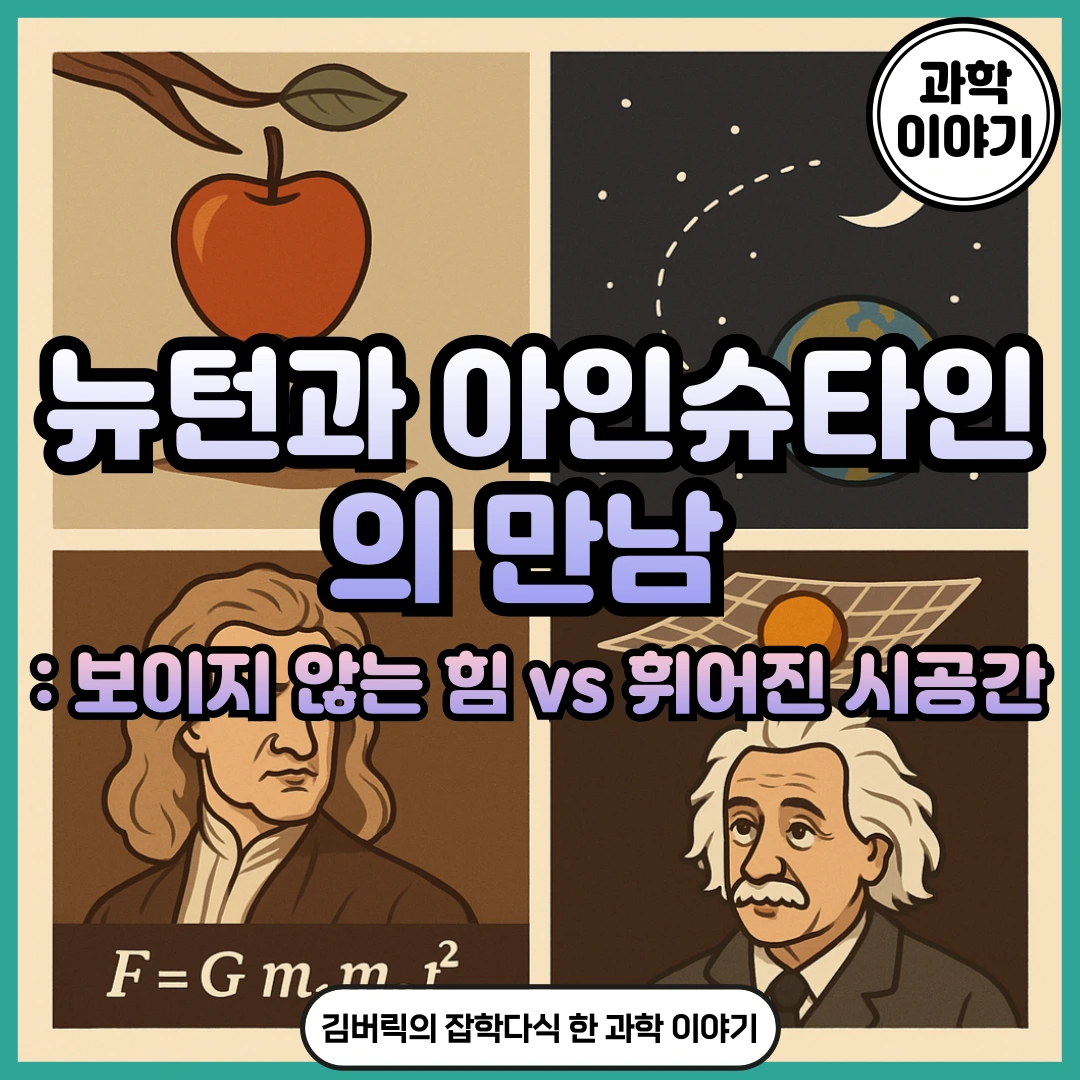“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중력을 발견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지만, 사실 뉴턴이 사과를 보고 곧바로 법칙을 떠올린 건 아니다. 그는 밤하늘의 달이 왜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지를 고민했다.
결국 그는 사과와 달, 즉 ‘지상의 일’과 ‘천상의 일’을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깨달음이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Law of Universal Gravitation) 이다. 이 글에서는 뉴턴이 이 법칙에 이르기까지의 사상적 여정, 그리고 그 이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 그것을 어떻게 확장했는지까지 함께 살펴본다.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만남, 보이지 않는 힘 vs 휘어진 시공간
요약
- 뉴턴은 모든 물체가 서로 끌어당긴다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제시했다.
- 이 법칙은 사과의 낙하와 행성의 궤도를 하나의 원리로 통합했다.
- 뉴턴의 세계에서는 ‘힘’이 공간을 통해 즉시 전달된다고 여겨졌다.
- 그러나 200년 뒤, 아인슈타인은 이 힘을 ‘시공간의 휘어짐’으로 새롭게 해석했다.
- 만유인력은 여전히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지만, 상대성이론은 그 배경을 더 깊이 설명한다.
- 두 이론은 서로 대립이 아닌, 정확도의 확장 관계로 이해된다.
사과에서 달로 ― 만유인력의 탄생
뉴턴의 이야기는 1665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이 흑사병으로 문을 닫으면서 시작된다. 그는 고향 울스소프의 시골집 정원에서 혼자 사색에 잠겼다. 어느 날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 생각했다.
“왜 사과는 항상 땅으로 떨어지는가?
그렇다면 달은 왜 지구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는 달이 ‘떨어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지구의 인력이 달을 끌어당기지만, 달의 전진 속도(관성)가 이를 상쇄하면서 지속적인 궤도 운동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식이 바로 다음과 같다.
F=G X {(m1 X m2) / r2}
- 질량이 클수록 인력은 강해지고,
- 거리가 멀수록 인력은 약해진다.
이 공식은 지상과 천상을 하나의 수학식으로 통합한 최초의 시도였으며, 뉴턴은 이를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Principia, 1687)』에 발표하면서 세상을 바꿔 놓았다.
우주를 통합한 사상 ― 뉴턴의 위대한 단순함
뉴턴의 위대함은 단지 수식을 만든 데 있지 않았다. 그는 우주를 단 하나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다. 별, 행성, 사과, 파도… 그 어떤 것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하늘의 궤도와 사과의 낙하를 같은 언어로 말하고 싶었다.”
그의 사고방식은 환원주의(reductionism) 의 정수를 보여준다. 복잡해 보이는 자연현상을 더 단순한 원리로 환원해 이해하려는 태도였다.
이 후, 뉴턴의 수학적 세계관은 이후 산업혁명, 천문학, 기계공학, 나아가 현대 과학 전체의 토대를 만들었다. 그가 제시한 이 단순한 법칙 하나로 사람들은 별의 궤도를 계산하고, 대포알의 궤적을 예측하며, 인공위성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이 완벽해 보이는 법칙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뉴턴을 넘어 ― 아인슈타인이 본 또 다른 세계
19세기 말, 천문학자들은 수성의 궤도가 뉴턴의 계산과 약간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 작은 오차가 결국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이론을, 1915년에는 일반상대성이론을 발표하면서, 그는 뉴턴의 “보이지 않는 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했다.
“중력은 힘이 아니라, 시공간이 휘어진 결과다.”
즉, 질량이 큰 천체가 주변의 시공간을 휘게 만들고, 그 곡선 위를 다른 물체가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끌려가는’ 게 아니라,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뉴턴의 법칙이 “왜 떨어지는가”를 설명했다면,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왜 그런 방식으로 떨어지는가”를 설명했다.
예를 들어, 태양 주변에서 빛이 휘어지는 현상, GPS 위성이 시간 보정을 해야 하는 이유, 모두 뉴턴으로는 설명되지 않고, 상대성이론으로만 설명 가능하다.
사과와 시공간 ― 두 이론의 공존
많은 사람들이 뉴턴과 아인슈타인을 ‘옳고 그른 관계’로 생각하지만, 사실 둘은 서로 다른 정확도의 세계를 다룬다.
- 뉴턴의 법칙 → 일상적 규모에서 거의 완벽 (지구, 행성 등)
- 아인슈타인의 이론 → 초정밀·고중력 영역에서 필요 (블랙홀, GPS 등)
예를 들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설명할 때 굳이 시공간의 곡률을 계산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태양 근처에서 빛이 휘는 현상은 뉴턴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 둘은 경쟁이 아니라, 현실을 다른 스케일에서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다. 뉴턴이 ‘사과의 법칙’으로 우주의 틀을 만들었다면, 아인슈타인은 그 틀을 ‘휘어지게 만들어’ 더욱 깊은 차원으로 확장했다.
마무리 ― 떨어지는 사과에서 시작된 우주관의 진화
뉴턴의 만유인력은 단지 힘의 법칙이 아니라, “세상을 수학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믿음의 시작이었다. 그 믿음은 오늘날 물리학, 우주론, 심지어 철학에까지 이어진다.
아인슈타인은 이 법칙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더 깊은 구조—시공간의 곡률—을 발견했다.
결국, 사과 한 알의 낙하가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법을 바꿔 놓은 셈이다.
관련 글
- 뉴턴의 만유인력:
https://kimverick.com/%ec%95%84%ec%9d%b4%ec%9e%91-%eb%89%b4%ed%84%b4-%eb%a7%8c%ec%9c%a0%ec%9d%b8%eb%a0%a5-%ec%a7%80%ea%b5%ac-%eb%8b%ac-%ea%b6%a4%eb%8f%84-%ec%9d%b8%ea%b3%b5%ec%9c%84%ec%84%b1/ - 아이작 뉴턴의 운동 법칙:
https://kimverick.com/%ec%95%84%ec%9d%b4%ec%9e%91-%eb%89%b4%ed%84%b4-%eb%a7%8c%ec%9c%a0%ec%9d%b8%eb%a0%a5-%ec%9a%b4%eb%8f%99-%eb%b2%95%ec%b9%99-%ea%b4%80%ec%84%b1-%ed%9e%98%ea%b3%bc-%ea%b0%80%ec%86%8d%eb%8f%84-%ec%9e%91/ -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https://kimverick.com/%ec%83%81%eb%8c%80%ec%84%b1%ec%9d%b4%eb%a1%a0-%ed%8a%b9%ec%88%98-%ec%9d%bc%eb%b0%98-%ec%95%84%ec%9d%b8%ec%8a%88%ed%83%80%ec%9d%b8-%eb%b8%94%eb%9e%99%ed%99%80/